
1444년(세종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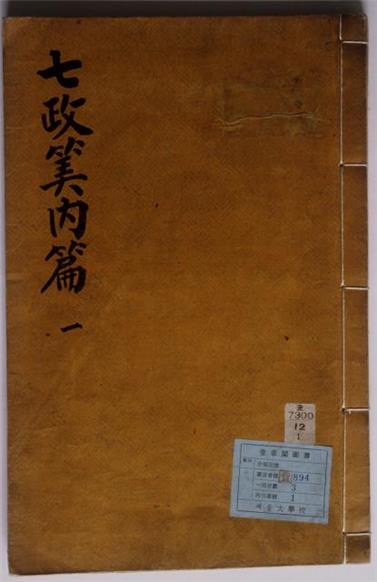
칠정산내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칠정산』은 『칠청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아울러 이른다. 조선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천문학 연구와 역서 편찬에 많은 공을 기울였고, 이는 1444년(세종 26) 두 책의 간행으로 결실을 보았다. 『칠정산내·외편』은 『세종실록』권156∼163에 실려 있으며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이 각기 독립된 형태의 서적으로도 간행되었다.
우리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역법을 받아 사용했다. 천하의 패권을 쥔 중국 황제는 스스로 역법을 만들지 못했던 주변 국가의 제후들에게 자국의 역법을 하사하였다. 중국은 송·원대에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역법을 만들었고, 이를 고려로 전했다. 고려는 당 역법인 선명력(宣明曆)을 쓰다가 1281년(충렬왕 7)에 원에서 만든 수시력(授時曆)을 받아들였다. 다만 수시력의 수용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고려 천문관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선명력을 주로 사용했고, 수시력은 제한적으로 이용하였다. 일·월식 계산과 오성(五星, 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 운동의 관측은 계속 선명력을 썼다. 고려 말에는 명에서 수시력을 일부 수정한 대통력(大統曆)을 받아들였지만, 이 역시 전면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천문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다. 특히, 1395년(태조 4)에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가 제작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자 누군가가 오래전에 대동강에 빠져 행방을 모르고 있던 천문도 석각본을 바쳤고, 이를 바탕으로 세로 2m의 대리석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음각으로 새겨졌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과 일부 상상의 별이 그려졌다.
예로부터 천문도는 제왕에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천명(天命)을 부여한다는 상징이었다. 그리고 제왕은 하늘의 뜻을 천문을 통해 파악해야 했다. 천문에 대한 이해는 제왕의 권력이었고, 제왕은 완벽한 천문 역법을 이해하여 책력(冊曆) 혹은 역서(曆書) 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군의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여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는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적으로 조선의 정치적 정당성은 세종의 천문 연구와 『칠정산』의 편찬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이후 세종 즉위 전까지 역법 연구는 활발하게 행해지지 못했다. 그러나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 발문(跋文)을 보면, 세종이 즉위한 후에는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유정현(柳廷顯)의 제안으로 역법을 교정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흠지(鄭欽之), 정초(鄭招), 정인지(鄭麟趾) 등을 중심으로 역법 연구가 이루어졌다. 『칠정산』이 1442년(세종 24)에 간행되었으니, 『칠정산』이 완성되기까지 20여 년간의 천문학에 대한 집중 연구가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역법을 교정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세종은 천문을 파악하는 데 전심전력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어떤 때는 일식과 월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역법 연구를 포기할 마음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이순지(李純之), 김담(金淡) 등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역법 서적의 편찬·간행 업무를 담당했다. 몽골의 야율초재(耶律楚材)가 제작한 『경오원력(庚午元曆)』, 원의 왕순(王恂)이 『수시력』을 쉽게 풀이한 『수시력입성(授時曆立成)』, 명에서 회회력을 추산한 『위도태양통경(緯度太陽通經)』 등을 조선에서 간행하여 연구하였다.
더불어 각종 역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는 명 원통(元統)이 편찬한 『대통력통궤』를 이순지와 김담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간행한 것이다. 『중수대명력(重修大明曆)』도 금의 조지미(趙知微) 등이 만든 『대명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문헌이다. 이외에도 『태양통궤(太陽通軌)』, 『태음통궤(太陰通軌)』, 『오성통궤(五星通軌)』, 『교식통궤(交食通軌)』, 『사여전도통궤』 등 많은 역서가 편찬되었다.
역법의 발달은 각종 천문의기의 제작과 함께 이루어졌다. 혼천의(渾天儀)·간의(簡儀)·규표(圭表) 등 해와 달을 관측하는 기구와 앙부일구(仰釜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 등의 해시계와 자격루(自擊漏)·옥루(玉漏) 등의 물시계 등이 제작되었다. 역법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각종 역서의 내용이 각종 의기를 통한 천문 관측과 시간 측정의 시험 결과와 일치할 수 있게 이론과 실험을 병행한 것이다.
‘칠정(七政)’은 일곱 천체, 즉 태양, 달, 오행성을 가리키고, ‘산(算)’은 계산한다는 뜻이다. 즉, ‘칠정산’은 태양, 달, 오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전통시대 역법은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모양을 보고 백성에게 때를 내려준다는 뜻이며, 역법은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여 이의 순환 주기를 계산해서 시간을 세는 것이다.
세종은 ‘칠정산’의 움직임을 통해 조선의 자연환경에 맞는 날짜와 절기를 알려줌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려 했다. 또한 일식‧월식과 같은 천문현상을 예측하며, 해와 달, 수성, 화성, 목성, 토성, 금성의 운행을 예측하며 천문현상에 대응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역법을 수용하여 사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칠정산내편』과 『칠정산외편』을 편찬하였다. 일반적으로 『칠정산』으로 통칭하여 부르기 때문에 두 책이 같은 내용을 나누어 담고 있다고 인식되는데, 엄밀하게는 서로 다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정산내편』은 원의 수시력에 대한 해설서이다. 그러나 원 수시력은 중국의 북경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칠정산내편』은 원 수시력을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칠정’의 운행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계산하고 천체 현상을 예측하는 모든 방법이 망라되어 있다. 즉, 태양과 달의 운동을 계산하여 연월일시를 정해 달력을 만드는 법, 태양의 운동을 계산하는 법, 달의 운동을 계산하는 법,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 법, 오행성의 운동을 계산하는 법, 네 개의 가상 천체인 사여(四餘, 紫氣星·月孛星·羅喉星·計都星)의 운동을 계산하는 법 등이 서술되었다.
『칠정산외편』은 전통적인 중국식 역법이 아니라 서역(西域, 중국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의 천문학을 담았다. 『칠정산외편』의 핵심은 중국 원·명시기에 아라비아에서 전래된 회회력(回回曆)이다. 이 회회력을 해설하여 날짜, 24절기, 한양의 일출과 일몰 시각 등을 구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즉,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us)의 이론에 기초한 서양 천문학이 이슬람권에서 더욱 발전되었고, 이것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용된 것이다. 따라서 칠정의 계산 방식이나 수치도 『칠정산내편』과 다르다. 일례로 『칠정산내편』의 1년이 365일 2425분이지만, 『칠정산외편』은 365일 5시 48분 45초로 지금 값보다 1초 짧다.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은 『칠정산』이 간행된 이듬해인 1445년(세종 27)에 이순지가 지었다. 『제가역상집』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편찬 배경이 기술되어 있다. 세종은 1445년(세종 27)에 이순지에게 명하여 여러 문헌에 섞여 나온 천문(天文)·역법(曆法)·의상(儀象, 간의·혼상 등의 천문기기)·구루(晷漏, 해시계와 물시계)에 관한 글들을 찾아내어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을 추려 부문별로 정리해 열람하기 편하게 제작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제가역상집』은 세종대에 행해진 천문, 역법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칠정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 서적이다. 세종대 약 20여 년에 걸쳐 중국의 천문학과 산학(算學) 등을 연구하고 각종 천문의기(天文儀器)의 제작과 천문 관측을 병행하면서 측정 결과와 일치하게 만들었다. 이는 중국과 이슬람의 과학이 조선으로 흡수되는 계기가 되었다.
『칠정산』의 편찬은 세종의 도전이기도 했다. 전통시대 동양사회에서는 역법은 천자(天子)인 중국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고, 새로운 역법을 선포하는 것도 오롯이 황제만 가능했다. 그러나 세종은 그러한 관례를 깨고 조선의 독자적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게다가 이는 중국 역법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역법까지 연구한 결과였다. 한 연구자는 세종대의 과학기술이 아라비아의 꺼져가는 전통을 중국 원의 과학 발달을 매체로 새롭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