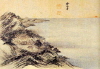왕실의 불교신앙과 원당사찰
고려 말부터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교배척운동은 정치적으로 힘을 얻었을 뿐 학문적 논쟁에 의한 정신적 운동의 소산은 아니었다. 그런 탓에 억불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불교는 여전히 많은 신도와 그들에 대한 교화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반 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왕실 인물로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불교의 폐해가 지적될 때에만 인심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억불정책을 추진했을 뿐 불교의 근절까지는 결코 염두에 두지 않았다.
태조는 독실한 불교도로서 창업 전부터 태고나 나옹 같은 고승의 재가문도였고, 무학과는 관계가 깊었다. 조선왕조의 창업에 전기가 되었던 위화도 회군 때는 승장 신조의 도움이 컸고, 등극 후에는 무학을 왕사로 삼아서 창업을 완성코자 했다. 세종도 만년에는 내원당을 세워서 불사를 거행하고, 불경을 즐겨 읽는 불교도가 되었다. 세조는 신미나 수미 등을 비롯하여 윤사로·황수신·한계희·김수온과 같은 조정대신들의 전폭적인 참여 하에 불교를 크게 중흥시켰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유교주의자로 행세했지만 개인적인 길흉화복에 관한 한 신앙심 깊은 한 사람의 불교도들이었다.
신앙심이 깊은 대비나 잦은 정쟁에서 청상과부가 된 궁중 여인들이 대부분 불교에 귀의했던 것도 왕실 불교를 흥하게 한 배경이
![]() 었다. 세종 때는 태종의 의비 윤씨가 삭발해 있었고, 성종 때는 19세에 과부가 된 덕종의 인수대비나 형수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등 많은 궁중 여인들이 불교에 귀의해 있었다. 이들은 궁중에 불상을 모셔 두고 정쟁에서 희생된 지아비의 명복을 빌거나 특정 사찰을 원당으로 정해서 대시주가 되기도 했다. 특히, 명종 때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대비는 보우(普雨)를 발탁해서 선·교 양종을 다시 일으키고 승과를 부활하는 등 불교의 중흥에 크게 이바지했다.
었다. 세종 때는 태종의 의비 윤씨가 삭발해 있었고, 성종 때는 19세에 과부가 된 덕종의 인수대비나 형수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등 많은 궁중 여인들이 불교에 귀의해 있었다. 이들은 궁중에 불상을 모셔 두고 정쟁에서 희생된 지아비의 명복을 빌거나 특정 사찰을 원당으로 정해서 대시주가 되기도 했다. 특히, 명종 때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대비는 보우(普雨)를 발탁해서 선·교 양종을 다시 일으키고 승과를 부활하는 등 불교의 중흥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왕위계승에서 탈락되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된 대군과 종척들 중에서도 불교에 귀의한 경우가 많았다. 정치와 단절한 불교도로 행세함으로써 정쟁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실형 효령대군을 들 수 있다. 효령대군은 왕위에서 탈락되자 천태종승 행호에 귀의한 이래 여러 사찰의 조영을 위한 모금에 앞장 섰다. 1432년(세종 14)에는 스스로 시주가 되어 한강에서 수륙회를 성대히 여는가 하면 회암사와 태안사 등의 여러 사찰을 원당으로 삼아 자주 행차하며 대법회를 개최했다. 1465년 세조의 원각사 창건도 효령대군이 회암사를 자주 왕래하며 원각법회를 열었을 때 여래가 현상한 상서로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표면적으로는 억불책이 강화되는 듯했지만, 국왕이나 왕실 인물들에 의한 원당사찰의 운영은 이런 저런 이유로 용인되고 있었다. 선왕의 무덤을 수호하는 능침사찰과 특정 인물의 명복과 안태를 비는 위축원당이 그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태실이나 어진·어필 등을 봉안한 사찰 등도 넓은 의미에서 원당에 속했다. 원당으로 지정되면 가람 일곽에 금표가 설치되고, 사세나 요역의 탕감뿐 아니라 전답을 하사 받았다. 게다가 막중지소로 관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유생들에 의한 침탈과 훼손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탓에 사찰들이 원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왕실에 줄을 대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폐사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왕실의 원당 운영은 그나마 불교 교단의 명맥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었다.
원당사찰의 운영은 고구려 때의 정릉사지로 그 연원이 소급된다. 통일신라와 고려 때에는 왕실 외에도 문벌귀족들의 개인 원당이 많이 경영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국한해서 운영되었다. 먼저 태조는 1390년(공양왕 2)에 공사를 시작한 공양왕의 원당이었던 개성 연복사 5층목탑을 1393년(태조 2)에 완공하고, 석왕사·진관사 등 여러 사찰들을 원당으로 삼았다. 특히, 계비 강씨의 정릉 옆에 흥천사를 세워서 명복을 비는 원당으로 삼았다. 이는 후대의 왕들이 능침사찰을 건립하는 선례가 되었다. 불교를 크게 배척했던 태종 자신은 능침사찰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지만, 선왕 태조와 선비 한씨의 건원릉과 재릉 옆에 능침사찰로서 각기 개경사와 연경사를 건립했다.
누구보다 불심이 깊었던 세조는 원당사찰의 운영에도 가장 열성적이었다. 그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변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는 명분 하에 국가적 사업으로 원각사를 건립했다. 또한, 요절한 맏아들 덕종의 경릉 옆에 정인사를 짓고, 자신의 치병 간구를 명분으로 강원도를 순행하면서 회암사·상원사·낙산사 등을 원당으로 삼고 전답과 노비 등을 하사함으로써 유생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금창사사지법’에 따라 사찰 신창이 금지되었음에도 창건 공사가 빈번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 조는 그때마다 폐사된 사찰터를 이용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를 피해 나갔다. 교묘하게 반대를 무마하는 이러한 논리는 이후 조선 후기의 능침사찰 건립 때 그대로 답습되었다.
조는 그때마다 폐사된 사찰터를 이용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를 피해 나갔다. 교묘하게 반대를 무마하는 이러한 논리는 이후 조선 후기의 능침사찰 건립 때 그대로 답습되었다.
도성 내에 국가원찰로서 장려하게 건립된 원각사는 조선왕실 불교신앙의 정점에 해당한다. 1464년(세조 10) 건립에서 1512년(중종 7) 철거까지 극히 짧은 기간에 위정자의 성향에 따라 흥망을 오갔던 불교계의 처지가 압축되어 있다. 숭유억불을 기치로 내건 집권 유교세력은 궁궐 정전에만 쓸 수 있는 청기와나 진채, 금채단청을 사용한 데다 그것도 경복궁과 가까운 거리의 도성 한복판에 세운 사교의 사원을 그대로 두었을 리 만무했다. 완공된 지 불과 24년이 지난 1488년(성종 19)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1404년(연산군 10)에는 국왕이 원각사를 기방(妓房)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1507년(중종 2)에는 대비 윤씨가 조종의 유훈이라 하여 건물들을 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512년(중종 7)에 이르러 공가로 남아 있던 원각사를 헐어서 그 재목을 연산군 때 집을 빼앗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불과 48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극단적인 흥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