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귀족 사회의 동요
〔학습 개요〕
고려는 중기에 이르러, 밖으로는 만주에서 일어난 금의 압력을 받고, 안으로는 지배층 간에 알력이 생겼다. 한편, 고려 귀족 사회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더니, 이로 인한 모순으로 말미암아 무신의 난이 일어났다.
무신의 난 후, 정권은 무신들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에 따라 천민 출신의 무신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신이 집권하는 동안, 신분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바라는 민중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무신들의 정권 쟁탈과 민중의 저항 운동 속에서 최충헌이 실권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굳혀, 이후 4대에 걸친 최씨 정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은 몽고와 끝까지 항쟁하였다.
학습 문제
1. 고려 귀족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것일까?
2.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3. 무신의 난은 어찌하여 일어났으며, 최씨 무신 정권은 어떻게 그 기초를 굳혔을까?
4. 무신의 난 후, 각지에서 민중의 저항 운동이 일어난 원인과 의의는 무엇일까?
이자겸과 묘청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기까지 7대 80여 년 간 왕실의 외척으로 있던 경원 이씨 세력은 그의 일족과 부하가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렸다. 인종 때 권세를 누리던 이자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까지 품었다. 이를 눈치챈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그가 먼저 난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자겸의 난이다(1126).
그 뒤, 이자겸과 그의 일당인 척준경과의 사이가 벌어져, 척준경은 이자겸을 내쫓고 잠시 권력을 잡았으나, 그도 얼마 안 되어 쫓겨나고 말았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성이 불타고, 또 금의 압력을 받아 나라 안팎의 정세가 소란해지자, 서울을 서경으로 옮기고 금을 쳐서 국위를 떨치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 주장에 앞장 선 사람들은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였다. 당시 민중들 사이에는 풍수 지리설이 유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을 미워하는 감정이 높았으므로, 묘청 등의 이러한 주장은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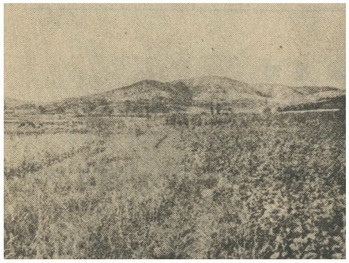
묘청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여 세운 궁궐이 있던 터이다. 평남 대동 소재.
천도 운동에는 묘청 등이 개경의 귀족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야심도 숨어 있었으나, 이것은 고려의 전통적인 북진 정책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천도 운동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에 묘청은,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1135), 결국 김부식이 거느린 정부군에게 평정되고 말았다.
무신의 난
고려 귀족 사회에서는 문신, 무신 사이에 차별을 두어, 정치 권력은 물론, 토지 분배, 교육 및 군사 지휘권 등에 있어서도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하였다. 같은 양반이면서도 푸대접과 멸시를 받던 무신들은 항상 불평을 품고 있었다.
드디어 이러한 불평은 터져, 의종 때에 정중부 등의 무신이 난을 일으켜 의종을 비롯하여 많은 문신들을 몰아 내고 무신 정권을 세웠다(1170).
그러나, 무신 정권이 성립된 후 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살해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한 뒤 이의민이 잠시 정권을 잡았으나, 그는 최충헌에게 살해되었다.
민중의 저항
이러한 무신의 난은 문벌 중심의 고려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귀족 사회를 붕괴시켰다. 특히, 정치 체제와 신분 질서가 바뀌어, 정치 질서는 무신 위주로 꾸며졌다. 그러나, 이후에 무신들의 부패와 횡포가 심해져, 농민과 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거기에다 무신 정권이 수립된 후로는 천민 출신의 무신이 큰 세력을 쥐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풍조는 민중을 자극하여, 사회적인 부당한 대우와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저항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 저항 운동은 무신 정권의 수립 직후부터 시작되어 최충헌이 집권하기까지 약 30년 간 계속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남부 지역이 심하였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천민들이, 그리고 전주와 진주에서는 노비들이 저항 운동을 일으켰다. 개경에서는 최충헌의 노비인 만적이, “삼한에서 천민을 없애자.”고 외치며 노비의 신분 해방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천민뿐만 아니라 농민도 각처에서 저항 운동을 일으켰는데, 경상도 운문(청도)의 김사미와 초전(울산)의 효심이 일으킨 것이 가장 유명하다.

최씨 정권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최충헌은,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민중의 저항 운동과 문신들과 결탁된 사원 세력을 진압하여, 무신 독재 정치의 터전을 굳게 하였다. 그리하여, 최씨 무신 정권은 4대 60여 년 간 계속될 수 있었다.
무신 정권이 성립된 후, 종래의 정치 기구는 유명 무실해졌다. 무신 정권 초기의 최대 권력 기구는 중방이었는데, 최충헌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정도감이라는 최고 권력 기구를 두고 강력한 독재 정치를 폈다. 최우 때부터는 그의 저택에 정방을 두고 정부의 모든 인사 행정을 맡아 보았다.
한편, 몽고가 침략해 오자, 최우는 강화도로 서울을 옮겨 항몽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학습 정리
1. 고려 귀족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쌓여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으로 나타났다.
2. 묘청의 난에는 서경파가 정권을 잡으려는 음모도 있었으나, 고려의 전통적인 북진 정책의 의지도 담겨져 있었다.
3. 신분적인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문신 정권을 타도하고 정치적 세력을 쥐게 되어, 고려 귀족 사회는 붕괴되었다.
4. 무신 정권하에서 벌어진 농민과 천민들의 저항 운동은 신분의 향상과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었다.